*이 글은 <황제내경> 이하 침구학 고전들을 심도깊게 분석하여 경락/경혈 이론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그 기원과 변화를 정리하며 그것이 역사적 실재로써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절대적 실체'로 고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고인들에게는 ' 언어, 문자, 지식, 개념' 등 과학기술 발전의 이기가 부재하였고, 그래서 ' 기, 또는 경맥, 낙맥' 등과 같은 크고 포괄적인 개념에 의존하여 그 이론의 가설을 구축하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나아가 여전히 우리가 '기'라고 칭하고 '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론을 부여잡고만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고인들이 기대했던 발전 방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결론 짓는다. 매우 공감가는 대목이다. 침뜸의 이론도 그 기법도 과학화되어야 한다는 본 블로그의 명제와 잘 부합하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針灸穴道的源起探討與MPS的關係
陳方佩 主任
台北榮民總醫院傳統醫學研究中心
1973년 長沙馬王堆西漢第三號墓에서 출토된 12만 자 백서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은 중국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중국의학의 보전 《黃帝內經》은 한나라 시대 이후 성립된 것으로 역대 중의가들에 중의의 근본이론으로 추앙받아 왔다. 《경맥편》은 이미 12개의 경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침십이원》 편에서는 오수혈은 11개의 맥 뿐이며, 모두 손가락끝이나 발가락끝으로 시작하는 향심의 주행 방식이다. 이처럼 명백한 모순이 병존하는 관계로 통일적인 설명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20세기 말의 백서가 출토될 때까지 내경 밖의 하늘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락 시스템의 형성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와 더불어 발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락 상에 혈도가 있을까? 경락과 함께 발전해 왔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발전했을까? 이것이 바로 이 글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다. 이름을 따지자면, 우리는 모두 청대 이후 통일된 361개의 혈명을 알고 있다. 배수혈은 내장에 따라 쓰여진 것 외에, 대부분 天文、丘陵、湖海,및 解剖部位에 의거하였고, 그 소속 경맥의 장부와는 무관하였고, 또 배수혈은 왜 모두 방광이라는 자그만 요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장기에 있는걸까? 즉, 만약 혈도가 이 경락의 공혈을 통과하고 기능이 이 장부와 관련이 있다면, 왜 장부에서 유래하는 이름을 짓지 않고 전혀 관련이 없는 星宿이나 山川으로 이름을 붙였을까? 이것은 고대인의 습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개의 심, 폐, 장위는 매우 중요하고 큰 기관인데, 왜 폐는 11개의 혈도 조절 및 기능인데, 담즙을 수용하는 작은 담낭은 44개로 혈도가 많을까?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해 고문헌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을 구하고자 한다
실제로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근막 증후군(MPS)과 탄력섬유통증(Fibromyalgia)에 의거해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을 찾는 과정은, 혈도의 以痛為俞 단계와 더불어 異曲同工의 묘미가 있어, 본문에서 이러한 각도에서 중서의를 비교하고 또 근대와 고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경혈(腧穴) 개념의 기원과 확립
오늘날 침구 교과서는 모두, 수혈의 본의는 인체 기혈 운행의 공극 혹은 통로로, 그 명칭은 고대 의적에서 서로 다른 사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砭灸處、節、會、氣穴、氣府、骨空、骨孔、孔穴、穴道 등을 가리키며, 또 인체의 장부와 경락기혈이 체표면에 주입되는 부위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1)
본능적으로 체표면의 아픈 곳을 누르면 이 부위를 특정 통증의 완화를 위한 경혈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억지스러운 생각일 것이다. 마왕퇴에서 출토된 백서에는, 비록 경맥의 최초의 순행법이 있고, 뜸법과 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경혈 명칭과 부위는 없고, 다만 맥명만 있다. 내경에 이르러, 비록 《靈樞‧背腧》에서 : "그 곳을 눌러 그 안에서 응하여 통증이 풀리면 그곳이 바로 경혈이다." "통증을 있는 곳을 경혈로 삼는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160개의 경혈, 경혈명, 주치 및 분경을 언급하고, 경락과 장부의 관계를 확립하고 경혈은 인체의 기혈이 운행하며 교회하는 곳이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소문·기부론》에서는 경혈을 "맥기가 발하는 곳"이라 했고, 《영추·구침십이원》에서는 경혈을 "신기(神氣)가 유행하며 출입하는 곳"이라 했다. 이처럼 내경은 이미 기의 개념을 충분히 사용하여 인체의 생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사실 경락의 본의는 "內連臟腑,外絡支節----"로, 교통작용이 있는데, 교통은 왜 필요할까? 신체는 외표(근육, 뼈, 피부, 힘줄)와 내강(심폐간비신)의 이분법적 관계를 드러낸다. 내강 기관은 상중하의 심폐, 간비 및 신으로 나뉠 뿐 아니라 장과 부(위, 장, 방광, 담 등)로 나뉜다. 이는 음과 양의 이분법 방식과 천인지 혹 상중하 삼분법 방식을 사용하기에 이른다. 음양과 표리(외내)는 8강의 중요한 구분법으로 간단하고 반복 확장 가능하며 다양한 천문(간지), 지리, 인체, 동식물에 적용할 수 있다. 몸이 전체로써 작용하면서 내외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 때, 내외 교통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경맥(또는 경락)이라는 명사는 중국 고대에 필연적으로 설립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가 음양으로 나누는 이러한 이론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혈이론의 형성과 발전
중의학 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혈의 형성과 발전은 세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無定位에서 定位(以痛為腧)로의 단계, 둘째는 定位에서 定名(命名)으로의 단계, 셋째는 定位定名에서 체계적 분류(부분별 또는 분경)으로 단계이며, 이를 통해 경혈의 수도 점차 많아졌다. 예를 들어, 내경에는 160개의 혈(단혈 25개, 쌍혈 135개)이 있었고, 진나라에 이르러 《갑을경》은 349개의 경혈(단혈 49개, 쌍혈 300개), 송원대의 《동인》과 《십사경발휘》는 354개로 증가하였고, 명대의 《침구대성》은 359혈로 증가하였고, 청대의 《침구봉원》에 와서 361혈이 형성되었다(표 1 (1)(2)(3)). 문제는 누가 어떤 근거로 처음에 160개 혈을 결정했는가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349개로, 또 361개로 늘어나게 되었을까? 만약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중대한 기본 원리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어떻게 새로운 혈도의 이름을 정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이침도, 두침도와 같은 새로운 혈점들은 어떻게 십사경과 통합될 수 있을까? 사실, 역사상의 많은 경외기혈은 근본적으로 경선 상에 있다. 그런대 예를 들어 두 눈썹 사이의 인당혈은 독맥 상에 있는데, 왜 정식 명칭으로 분류되지 않았을까? 체표면에만 표기된 유중(유두)혈은 과연 위경 중 하나가 맞을까? 게다가 늑간과 척추 사이에는 혈자리 배열 간격이 일정하지만, 다리와 팔의 혈과 혈 사이에는 길고 짧은 것이 있다. 심경 완부에는 짧은 범위에 4개의 혈이 있고, 담경 대퇴 외측에는 겨우 2-3개의 혈이 있다. 인체에는 반드시 연속되는 세포가 존재할텐데, 왜 연속해서 내장의 특징을 반응하지 못할까?
表1. 歷代 十四經穴 總數 對照表(3)
| 年 代(公元) | 作 者 | 書 名 | 穴 名 數 | ||
| 單 穴 | 雙 穴 | 合 計 | |||
| 戰國(公元前)475-(前)221 | 《內經》 | 約25 | 約135 | 約160 | |
| 三國、魏256-260 唐682 |
皇甫謐 孫思邈 |
《甲乙》 《千金翼》 |
49 | 300 | 349 |
| 宋1026 元1341 |
王惟一 滑伯仁 |
《銅人》(1) 《發揮》 |
51 | 303 | 354 |
| 明1601 | 楊繼洲 | 《大成》(2) | 51 | 308 | 359 |
| 清1817 | 李學川 | 《逢源》(3) | 52 | 309 | 361 |
(1)《銅人》、《發揮》增加單穴2:靈台、腰陽關係出自《素問.氣府論》王冰注;
雙穴3:膏肓俞、厥陰俞係出自《千金方》;青靈出自《聖惠》。
(2)《大成》增加雙穴5:眉衝出自《脈經》;督俞、氣海俞、關元俞均出自《聖惠》;
風市出自《肘後》。
(3)《逢源》增加單穴1:中樞;雙穴1:急脈;皆出自《素問.氣府論》王冰注。
유사한 문제는 또 있다. 즉, 혈명의 위치가 먼저 정해지고(누가 정하든 간에). 귀경의 체계화 노력은 후인들의 걸작이었다는 점이다. 공도가 장부 기혈이 발하는 곳이라는 정의에 억지로 맞추려면, 장부와 경락의 관계를 확립하고 氣血이 모든 생리 현상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의학사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경혈과 경락의 관계는 고정불변한 "사실"이 아니라, 오랜 인위적인 취사선택의 세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漢代에서 당, 송, 원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견해들이 모두 일찍이 각각 류파를 이끌었는데, 은연중에 중의학 철학적 사고가 역사의 긴 흐름에서 가져온 풍부한 사료를 관통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이며, 그 내외연관, 상하 소통으로 입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호흡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원나라는 중국 역사 전체에서 비교적 낯선 왕조였다. 몽골어는 한인의 주요 문자였는데, 왜 전승에서 누락되었을까? 어떻게 만주족이 입성한 청나라가 최종적으로 편찬하여 근대 중국 침구학과 같은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을는데, 이것이 일종의 강력한 통일이었을까? 우리는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역사는 물론 미래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혈(腧穴)의 命名
손사막(孫思邈)은 "모든 공혈은 이름이 헛되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모두 깊은 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太素》 권11, 《본수》 주에 따르면, "제 수혈의 혈명은, 《명당》이 해석하였다". 양상선의 수권(기타는 일실)을 고증하면, 수태음폐경에 속한 혈명의 의미를 모두 설명한다. 예를 들어, "수태음맥은 폐에 속하고, 폐는 가을에 주하며, 맥이 시작된 곳을 소상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략적으로 나누면 천체에 본을 둔 혈명, 예를 들어 자궁, 천추와 같은 혈은 주로 인체의 흉부와 두부에 있다는 것이다. 양계, 지기과 같은 地體에 본을 둔 혈명은 주로 인체의 팔다리와 관절에 있다. 신당, 장문과 같은 宮體에 본을 둔 혈명은 대부분 인체의 흉부와 복부에 있으며, 심수, 신수와 같은 인체에 본을 둔 혈명은 주로 배요부에 있다. 소택, 여태와 같은 卦體에 본을 둔 혈명은 주로 인체의 괘위 및 경락에 있다. (4) 그러나 장부의 이름을 따서 경선으로 명명하는 것만큼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백서로 돌아가면, 《足臂》와 《陰陽》에는 모두 수혈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단지 자구로 병을 치료할 때 "모든 병을 앓는 자는 모두 오래도록 ×× 온맥을 유지한다"고만 적혀 있다. 내경'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면 경혈의 발견과 치료가 처음에는 경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소문•조경론》에서 언급한 守經隧,言刺灸法은 아직 경혈을 중시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또 다른 氣穴刺灸法은 《소문·기혈론》에 365혈이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러한 혈도와 경맥 또는 기경팔맥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소문·골공론》에서 말하는 風府、 譩譆、眉頭、失枕、 八骨翏、寒府,그리고 水俞 57穴혈 등은 모두 체표면 부위나 골공을 표지로 하며, 이들 경혈의 소속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추•열병>에 따르면 '열병 59자'는 양손의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3씩 12痏(*멍 유, 경혈을 의미)이고, 다섯 손가락 사이에 각각 1씩 8痏, 족도 이와 같으며, 머리에는 전발제에서 1촌 들어가 외방 3푼에 각 3씩 6 痏이고, 다시 발제에서 3촌 들어가 5씩 10 痏 이고 귀 앞뒤 입 아래에 각 1, 항중에 1로 모두 6痏이며, 巔上 1, 囪會 1,髮際 1,廉泉 1,風池 2,天柱 2이다. 설명된 것들은 모두 신체 표면으로 표시되며 위치를 직접 나타낸다.(5) 경혈의 발달 초기에는 반드시 눈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하며, 머리카락의 경계에서는 귀 앞뒤로 직접 관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미 髮、口、耳、手指 등의 이름이 붙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 위치가 있다고만 말하고 아직 통일된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MPS의 유발점과 같이 아직 위치를 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아직 이름은 붙지 않았다. (6) (7)
《소문·기부론》, 《영추·본수》 등 편에는 경혈귀경의 내용이 나오지만, 수궐음경이나 그 경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은 단지 '십일맥'의 기초에 근거할 뿐, 아직 십이경맥으로 발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록된 160개의 혈은 족삼음, 족삼양, 수삼양, 수이음(소음, 태음) 및 임독맥에 분포되어 있으며, 수궐음(천지혈만 있음)경도 없고, 그 오수혈도 없었다. 당시의 수소음경 경로와 혈명은 사실 후대의 수궐음경과 거의 같다. (5) 즉, 비록 초기에 이미 경과 혈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질서있게 순환하며 통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랜 기간의 발전 과정을 거쳐야 했다.
* 어떻게 경락으로 경혈의 발전 과정을 총괄하였을까 :
현존하는 침구 의적을 살펴보면, 경혈의 배열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하나는 頭面軀幹分部,四肢分經으로 나뉘고, 四肢의 경혈은 모두 향심의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황보밀의 《갑을경》, 손사막의 《천금방》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경락을 따라 경혈을 배열하는 것이며, 순서는 경맥의 순행 유주 방향과 일치한다. 양상선은 《명당》에서 경맥을 열두 권으로 나누고, 또 다른 기경팔맥을 1권으로 하고 먼저 폐경으로 시작, 체례가 엄격하며, 총 349혈로 이 방법을 처음 창시한 사람이다. 송왕조 때 유일한 《동인경》과 元滑壽《十四經發揮》 그리고 현대 《중국침구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지만, 혈의 이름과 수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8) 이하에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皇甫謐의 《甲乙經》
晉朝의 皇甫謐은 字는 士安( AD 215~282)이고, 손에 책을 놓지 않고 ... 《針灸甲乙經》과 《帝王世紀年曆》 등을 저술하였다. 《甲乙經》序文에 : "內經素問、鍼經、明堂孔穴針灸治要의 세 가지 책이 있는데 --- 서로 잘 맞추고, 쓸데없는 건 삭제하고, 그 중복을 제외하고, 그 정요를 논한 것이 갑을경 21권이다." (2) 그는 349개의 혈에 대한 별명, 부위, 취법, 교회, 맥기 발생, 침구술 방법, 자침 깊이, 유침 시간 및 금침 금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침술 치료 방법을 병증에 따라 분류하여 침술요법의 선례를 열었다. 이 역사적인 총결산은 후대에 이 책에 대해 정해진 경혈에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게 했으며, 유일하게 주의해야 할 점은 분경배열법(分經排列法)의 차이이다. 王燾가 처음으로 완성한 '십이인명당도'에는 임독맥이 별도로 나열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대 滑伯仁이 쓴 《십사경발휘》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頭身의 경혈이 경에 따라 분류 배열되었다.(9).
황보밀은 처음으로 畫線布穴法을 창안했는데, 이는 《내경》에서 말하는 경락 순행이 체표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표에서 사용할 때 의자는 자신의 뜻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갑을경》은 인체 내 경락을 근거로 남녀노소가 공유하는 체표 특징을 표기로 삼아, 구역별로 선을 그어 총 60여 개의 포혈선(布穴線)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 흉골 절흔과 검돌기를 일선으로 연결하면, 천돌에서 전중, 중정까지 7혈이 배열된다.(9) 혈점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결하려면 경맥이 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연결한 《갑을경》을 거친 다음, 점점 작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으로 확장이동하고, 마지막으로 경맥 개념에 대담하게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혈도 내용의 확장도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양노혈에서는 《영추》에만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수태양의 본은 외과 뒤에 있다." 《갑을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양노는 수태양의 극이고, 과골 상의 빈곳으로 손목 뒤 1촌 함중이다. (9) 간단한 기초 위에서 발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내용이 점차 풍부해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은 한약재의 발전원류에서 더욱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마치 일찍이 단서가 있기만 하다면, 후세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시대와 시간을 끊임없이 얽고 확장하며, 옛것을 따르고 혁신하면서 새것과 옛것을 연관시켜 하나의 '존재'로 영웅을 정해온 것처럼 보인다.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고, 반대로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에 옛것을 따라 존중할 뿐이며, 옳고 그름운 확실치 않다. 선배가 먼저 "가설"하고 "후배"의 증명을 기다린다. 그러나 후배는 선배가 이미 "설립"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시간을 설명하는 많은 "이미"나 "오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오늘날 중국의학의 논의 핵심은 바로 "역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역사 없이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이미 시간 문화에 의해 층층이 포장된 중국의학의 본질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 주제에 대해 연대별로 중의학 전적을 분석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방대한 중의학 자료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어야 한다.
2.楊上善의 《明堂類成》
楊上善은 隋唐 사람으로 《黃帝內經太素》,《黃帝內經明堂類成》(以下《明堂》이라 약칭)을 편주하였다. 이들 자료는 南宋 후기 망실되었다가 清末에 일본에서 다시 전해졌다. 12개의 경맥이 각 1권, 기경팔맥이 1권,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권은 수태음폐경으로, 순행, 폐생리, 경혈, 부위, 취혈법, 주치를 기술하고 있으며, 총 349혈이 경맥 순행류주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8).
기경팔맥에 대한 설명에서, 기경팔맥 像泗、漳、沅、澧各水,奔向漢水와 長江,혹은 入黃河 등도 경락의 구성 요소로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경맥의 순행을 마치 강이 지상에서 흐르는 현상처럼 보아 인체의 생리적 역할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임의 2맥은 子胞에 함께 작용하므로 月事가 있는 까닭에 출산을 할 수 있다.(8) 즉, 여성에게 월사와 자포가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론적 설명을 찾기 위해 '임충맥'이라는 이름의 상상의 월사의 원을 정했다. 사실 《내경》에는 해부, 생리, 병리, 체질에 대한 설명이 이미 있으며, 《갑을경》에서는 정리 분류를 했을 뿐인데, 이는 고대인들이 당시대의 지식을 상당히 실용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현상을 관찰, 해석, 귀납했음을 나타내 준다.
양상선은 또한 자법을 논하며 "자침의 방법으로, 기를 조절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소문·刺志論》: "무릇 실이란, 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허란 기가 나오는 것이다. 기가 실한 것은 열이고 기가 허한 것은 한이다." 당시 이분법을 사용하여 직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열과 한이 있었기 때문에 허실을 사용하여 둘로 나누었고, '기'는 물질 기준의 대명사였다. 양씨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실이고, 정기가 나오는 것이 허이다. 땅은 병을 보사해주는 곳이다. 손으로 만져보아 地熱이 있는 사람은 병소가 실하니 사를 할 수 있으며, 地冷이 있는 사람은 병소가 허하므로 보하는 것이 좋다". (8) 그 당시의 허실은 피부를 만지는 직접적인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어떨게 열이나 냉을 알 수 있을까? 기의 양이 얼마인지, 또 어떨 때 '보'를 하고 또 '사'를 해야 하는지, 즉 "기"가 실질적인 성분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여 氣 또는 地表、虛實、補瀉라는 용어를 썼을? 왜 영어나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을까? 물론 이유는 단 하나, 즉 2000년 전의 한당 시대에는 아직 영어가 없었다! 중국인의 문물 사상이 너무 일찍 창작되었다는 것은 원래 그 장점이었지만, 현대에서 서양과 비교할 때 종종 단점으로 변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든, 우리가 전적을 돌아보면 언어와 문자의 제한이 고대인들이 과학을 이해하는 노력을 방해하는 큰 이유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대 문자와 현대 문자의 세대 차이를 건너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실용적인 측면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일 것이다.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문법이나 기본 기호를 먼저 연습하는 것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국가에 가서 생활하고 현지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elephant"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회색 긴 코의 큰 동물을 보았을 때,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코끼리"를 "elephant"로 번역할 수 있다. 알고 보니 세상에 그런 사실이 정말 있었군요. 번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아닐 것이다!
인류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인류라는 속종을 결정해 왔다. 중국 고대인들이 경락을 가지고 있었을 수 없고, 외국인들도 없으며, 또한 외국인이 신경이 있을 수 없고, 중국인들도 그렇지 않았다. 평면 지리에 관한 한, 발음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가리키는 바가 같아 번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직 연대에 관해서는 고대인과 현대인의 발음이 다르고 정의가 좁고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을 수 있다. 사람의 형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식으로 인한 차이는 사실 존재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실용적인 현상 묘사일수록 우리가 역사 생활에 대한 명료함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인위적인 해석 문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3.견권(甄權)이 그린 明堂圖
甄權 (AD 540), 수당 許州扶溝人 , 저서 《명당인형도》 1권이 있다. 仰人、 伏人、側人 3가지 그림으로 秦承祖가 그린 針灸圖(이미 소실)를 원본으로 하고, 《갑을경》 등의 저서로 교정하여 많은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 그림은 여전히 49혈이 빠져있고, 상하가 전도되어 있으며, 앞뒤가 바뀌어 본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頭身分部,四肢分經의 방식에 따라 《명당침구경혈도》를 새로 편찬하였다. 그림과 텍스트 설명에 따르면, 경혈의 혈명은 총 349개이며, 그 중 단혈은 49개, 쌍혈은 300개이다. 각 혈에는 혈명, 별명, 위치, 취혈법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전편에 걸쳐 주치증이 없다는 점이다.(10)
《甲乙經》과 서로 다른 것은 아래와 같다:
○甲乙:頭前髮際兩額角之間列為一橫行,前後髮際之間分四縱行,面不分行。
○明堂:前髮際橫行歸入仰人面,後髮際腧穴則歸入伏人後頂,穴以經定。
●甲乙:位於季𠗟與髀區之間的章門、帶脈、五樞、京門、維道、居杄六穴,列為腹部。
●明堂:歸入側𠗟。
◎甲乙:下列諸穴未歸經。
◎明堂:間顒、巨骨、間杄、秉風、天杄、肩井歸于手陽明經,肩貞歸于手太陽經,臑俞 、天宗、肩中前、曲垣歸于手少陽經,會陰歸于腎經,氣衝歸于脾經,臑會歸于肺經(亦與現 代不同)。
仰人、伏人、側人의 세 가지 방식은 역사상 획기적인 작품으로, 이는 초당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으며, 서로 다른 혈도의 귀경 또한 같지 않다. 부위나 경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장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연속 관찰의 분류 및 사용일 뿐이다.
근대 50년 동안 MPS의 발전을 살펴보면, 먼저 상지, 하지, 머리 등 근육 위치에 따라 각 Trigger point의 위치가 구분되었다. 최근까지 근섬유통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의한 것 중 하나는 몸 전체에 걸쳐 양측 각 9개의 통증 지점 중 13개의 지점인데, 이 18개의 지점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침 인체의 정방향, 후면, 측면 세 개의 그림을 사용했다.(11) 甄權의 세가지 사람 형상에 비유하자면, 이 둘은 1300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체표면에서 혈점을 분류하는 과정이 이렇게 유사하니 놀랍지 않는가! MPS의 창작자가 당대 고대인의 꿈을 꾸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고대인과 현대인은 모두 인간이고 형체가 동일하며 근육이 뼈를 움직여 활동했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영웅의 견해는 약간 비슷할 수밖에 없다!
4.孫思邈의 明堂圖 고증:
孫思邈은 隋唐時期 京兆華原人으로 후손들에게 '藥王'으로 존경받았으며, 저서로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各 三十卷이 있다. 《要方‧卷廿九針灸上》에 따르면:
"구 명당도는 연대가 오래되어 전사가 잘못되어 지침이 부족했으나, 오늘날 甄權 등이 새로 집필된 것에 의거할 수 있다. ---십이경맥은 오색으로 만들어졌고 기경팔맥은 녹색으로 만들어졌으며 세 인형의 공혈은 총 650개, 앙인 282개, 배인 194개, 측인 174개이다." 손사막은 견권의 삼인도를 사용하고, 또한 채색 표시를 하여 역사상 가장 초기의 채색 경락 혈자리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요방》에서도 처음으로 손가락 비교 정위법을 소개했다. "환자로 받은 남좌여우 중지의 손가락 위 첫 마디가 1촌" 또는 "엄지손가락 첫 마디 횡 길이가 1촌치"이다. 수당 이전의 정위법은 골도법과 체표 표시법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장 기능이나 특수 효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 표면에 지도나 경위선을 그리는 것처럼 먼저 "인지"를 중요하게 여겨, 눈에 보이는 형태로 위치를 정한 후 그 내면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한 번 팔강의 표리 개념에 부합케 하였다.
5.敦煌의 《灸經圖》
1900년 敦煌市 莫高窟藏經洞에서 고대 灸法圖 한 권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둔황 '灸法圖'라고 불린다. 한자로 쓰여진 여러 장의 누드 인간 그림이 있으며 뜸요법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 중 52혈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광기를 치료하려면, "天窗、肩井 --- 족심에 각 500장 뜸을 뜬다." 장수가 꽤 많다. 내경골도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족삼리는 슬하 4촌"와 같은 식이다. 그러나 배중선에서 2.3촌 떨어진 혈을 채취하는 방법은 배부 양측선 사이에서 혈을 취하는 것으로, 고대 유파의 특징인데 당나라의 《비급천금요방》과 남송의 《침구자생경》에서 볼 수 있다.(13) 경혈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을 무렵으로, 신체에는 다양한 경혈이 있을 수 있었으나, 경전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상실되거나 14대 경맥으로 승진할 기회를 잃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경혈 귀경이 선택적 과정을 거치며 내장과 관련이 없는 기능적 조직이 현존하는 방식임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어떤 혈을 어떤 이유로 선택했을까? 이미 존재하는 이름이나 눈에 보이는 효능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이론으로 테두리를 그은 걸까요? 이론에 부합하는 것은 통일된 것이고,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전승될 수 없는 것이었을까? 이것들은 다시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고대인들의 선택 근거는 무엇일까?
근거가 없다면 마음대로 했을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담하게 가정할 수 있다. "사실 온몸이 혈도가 아닌 곳이 없다." 마치 자연이 어디에나 아름답듯이, 음악은 소리 없이는 듣기 좋지 않고, 색채가 없이는 그림이라 할 수 없다. 학습 초기에는 항상 힘든 점이 있고, 반드시 단순함이 초석이 된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식이 더 넓어지며, 산을 보는 것은 여전히 산이지만, 마음속은 이미 십만 팔천 리 밖에 있고, 유형무형이며, 무형유형이다. 마치 신체 표면에서 MPS의 반응점을 찾는 것처럼, 모든 피부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시적이고 단순하며 분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복잡한 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심의 학습은 성숙해 가는 경향이 있다. 자연적으로 약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복잡성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분류를 하려면 계산, 분류 분석 및 분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극한에 도달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우, 반드시 단순한 渾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학습 거리를 전개할 수 없다. 이것은 자연의 윤회 또는 순환의 필연성이다!
6.王燾「十二身流注五臟六腑明堂」의 고찰
唐朝의 王燾는 天寶11年(서기 752년) 《外台祕要》를 편찬하고 최초로 十二身彩色針灸俞穴圖를 창안하였다. 그는 견권과 손사막의 3인채색침구경혈도를 계승하여 《갑을경》 명당을 기준으로 하여 십사경맥을 주체로 12개의 人身彩色經穴掛圖를 창작해냈다. 그림의 몸길이는 7척 5촌이며, 공혈의 총수는 665개(《갑을경》보다 8개의 쌍혈이 더 많다)이며, 공혈에 붉고 검은 표점을 써서 표시하고, 뜸법의 금기흫 나누었고, 침자법을 권장하지만은 않았다. (14)(以分列灸法之禁宜,但不推崇針刺法)
「十二人明堂」 은 열두 명의 사람으로 수족십이경맥을 그린 것으로, 오색은 오행과 내장의 관계에 따라 신장인에서는 짙은 녹색으로 임맥을 그리고 방광인에서는 연한 녹색으로 독맥을 그려 총 14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갑을경'과 '요방'의 공혈 외에도 고명당도의 7개 기혈, 즉 後腋、轉谷、飲郤、應突、月劦堂、旁廷、始索과 , <要方>의 灸療要穴 膏肓俞가 추가되었다. 총 357개의 공혈명이 있으며 쌍혈 308개, 단혈 49개, 총 혈수는 665개이다. 하지만 王燾가 膽腑人에 7개 혈을 수록했지만, 후세의 의사들은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표 2에는 王燾의 십이경혈 수와 현재 사용자의 비교가 나와 있으며, 분명히 차이가 있다.
表2.王燾十二人經穴與現代比較
| 經 名 | 今穴數 | 王燾穴數 | 經 名 | 今穴數 | 王燾穴數 | |||
| 1. | 肺 | 11×2=22 | 9×2=18 | 7. | 心 | 9×2=18 | 16 | |
| 2. | 大腸 | 20×2=40 | 45 (單3,雙21) |
8. | 小腸 | 19×2=38 | 26 | |
| 3. | 肝 | 14×2=28 | 22 | 9. | 心包 | 9×2=18 | 16 | |
| 4. | 膽 | 44×2=88 | 104 | 10. | 膽 | 44×2=88 | 104 | |
| 5. | 脾 | 21×2=42 | 48 | 11. | 膀胱 | 65×2=130 | 144 (單22,含督脈,雙61) |
|
| 6. | 胃 | 45×2=90 | 93 (單1,雙46) |
12. | 三焦 | 23×2=46 | ||
注意
그 서열은 肺→肝→脾→心→心包→腎→三焦로 現代와 같지 않다(見表3). 경맥이 서로 순환하는 순서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개선된 결과이며 인위적으로 구분된 것이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십이인명당'은 '갑을경' 및 '명당삼인도'와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중 《갑을》과 《요방》은 모두 머리, 얼굴, 가슴, 배, 등의 혈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행으로 논하며 경맥에 속하지 않았다." 송대 王唯一 《동인경혈침구경》의 石經圖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경맥을 순서대로 하지 않았고 머리, 얼굴, 어깨, 팔---을 그 순서로 하고 있다. 팔다리는 경맥을 논하며 모두 구심성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았고 장부와 거의 연결되지 않았다. 고대의 혈도는 체표면 발견을 우선시하며, 수가 많고 암기와 학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위별로 분류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손에서 머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에서 가슴까지의 선 방향도 아직 통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두 개의 선에서 기(氣)를 따라다니며 공혈을 통해 장부의 기를 조절할 수 있었겠는가?
表3. 近代經絡臟腑表裏流注表(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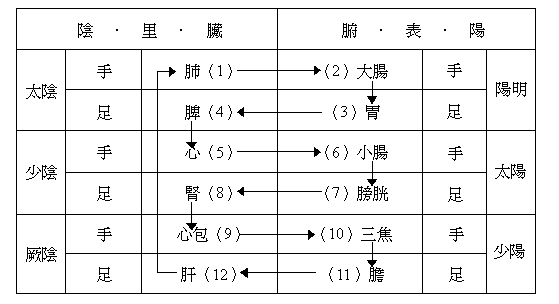
하지만 王燾는 경혈과 장부를 연결하는 관계를 구축한 최초의 인물이며, 처음으로 정, 측, 와위 세 사람의 여러 경맥을 혼합한 명당도를 역사상 첫 번째 十二經分經圖로 수정했다. 사실 이미 임독맥을 포함하고 있지만, '십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에 국한되어 있어 수족으로 경을 칭하지 않고 모모의 臟人,모모의 腑人이라고 명명했다. 비록 장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인 것 같지만, 혈도의 이름은 여전히 장부의 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특히 삼초는 단지 통조수로일 뿐 고정된 육부가 없었다. 체표면의 혈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조절할 수 있을까? 심포도 '심'과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이는 재상 대신들의 등급을 나타내며, 신주가 직접 와서 일을 처리하게 하지 않고 심의 臟氣를 조절할 뿐인데, 왜 굳이 심포을 찾아 12라는 숫자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즉, 내경문에서 이미 수(족)태(소)음(양)폐, 담경 등을 사용하여 경맥의 방향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장강대하의 지리적 상황을 관찰하여 인체의 혈맥 운행의 생리적 상태를 유추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선의 개념을 제공하며, 이미 나타난 체표면의 명칭과 위치와는 다른 사고방식인 것 같다.
成都中醫藥大學,宋興의 연구에 따르면, 《甲乙經》이 창안한 선으로 그려낸 布穴法은 체표면의 혈점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경락"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혈점을 체표면의 특정 위치에서 장부와 경락의 기가 전달되는 것으로 묘사했다.(9) 이렇게 해서 비로소 체표와 내면의 개념을 연결하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씩 공혈이 발견되어 내장의 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내경》 경락의 초기 개념도 결코 체표의 선을 발견하여 신비로운 "고인의 지혜"를 나타내 준 것은 아니었다.
《十二人明堂》을 생각해 보면, 《甲乙經》 혹은 《明堂三人圖》과 孔穴歸經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心臟人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 이 시기의 귀경 시기가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각 책의 연대는 다르고, 각 저자도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교환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아마도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이전 책을 "수정"했을 것이다. 과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국 전통의학의 전체 역사를 여전히 엿보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어떻게 쉽게 청말 시기의 '서면 심사' 자료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역대 현의들이 혈명과 경맥을 연속적으로 볼 때의 혼란스러움 때문이다. (서면 심사의 의미는 역대 의가들이 스스로 기공을 연마하여 기의 체내 운행 방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며, 혈도가 체표경선에 배열된 것을 발견한 것도 스스로 몸을 두드리거나 특효혈을 발견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앞에 써놓은 글씨가 흐트러지고 앞뒤가 모순되는 것 등을 '깨달아' 다시 베끼며 거듭수정하여 썼다.)
*特定穴의 概念源流와 發展
《내경》의 특정혈은 주로 오수혈, 원락혈, 수모혈, 하합혈 등을 가리키며, 《난경》에 이르러서야 팔회혈과 경혈의 오행 속성을 보충하였고, 《갑을경》에서 또한 郤穴과 交會穴 등이 추가되었다. 오수혈은 《영추·구침십이원》에 처음 보이며, 경기의 出溜注行入을 정형수경합의 오수혈에 분속시켰다(수소음심경은 《침구갑을경》에 이르러서야 완비됨). (1) 여전히 맥의 개념은 산천과 하천에서 유래한 것이며 모두 작은 곳에서 중심부로 합류하여 기 전달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수혈에 관해서는, 《영추·배수》 편에서 원래 다섯 개의 5장만 있었고, "모두 협척에서 3촌의 곳이다". 5부의 명칭에 대해서는 《소문·기부론》에서 언급되었지만, 혈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맥경》이 완비된 후에야 《갑을경》에 삼초수가 추가되었다. 또한 맥경에 이르러 비로소 5장5부의 모혈의 명칭과 위치가 확립되었고, 《갑을경》에서 삼초모 석문이 추가되고, 후대에 심포모 전중이 추가되어 비로소 정리되었다.(1) 이로부터 이 수모혈과 오수혈이 오행의 개념을 맞추기 위해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결국 12라는 숫자에 부합하게 되었지만, 먼저 어떤 내장에 낙하고 어떤 내장과 통하기 때문에 모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5장5부는 背中과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알려진 신경분절의 상황과 일치하며 방광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고대인들이 혈명을 세운 의도는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장부의 기를 조절하기 위해 세운 것'은 아니다. 즉, 경락과 혈도는 실제로 생리해부 현상을 마주하는 두 가지 개념이다. 만약 강경파가 이러한 12개 선과 361개 지점에 의해 제한된다면, 오히려 내경 창조의 본래 의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阿是穴
《漢書‧東方朔傳》顏師古注에,'阿'는 '痛의 뜻이라 했다. 阿是의 명칭은 《要方‧卷第廿 九針灸,灸例》 에서 처음 볼 수 있다. "아시의 법이 있으니, 누가 병통이 있다고 하면 그 위를 눌러보아 바로 그곳이라고 하면 공혈을 따지지 말고, 즉 시원하거나 아프다고 하는 곳이 바로 阿是이니 뜸을 뜨면 모두 효과가 있으므로 아시혈이라고 한다." (12) 《소문·무자론》은 "빠르게 눌러서 아프다는 느낌이 있으면 자침한다. 《영추·배수》: "신수는 14초(추) 사이에 있으며, 모두 척수를 끼고 3촌 떨어져 있다. 이를 얻고자 하면 그곳을 눌러 통증이 풀린다고 느껴지면 그곳이 경혈이다." 《영추·오사》에도, "사기가 폐에 있으면 병이 피부에 있고 아프다. ---, 손으로 빠르게 눌러 쾌연하면, 자침한다." 사실 "아시"의 진정한 의미는 《천금방》의 원문 앞부분에 주의를 요한다. "오촉은 구법을 많이 행했는데, 아시의 법이 있었다...." 그중 오촉이 가리키는 지역에서 吳는 현재의 장강 중하류와 浙北 일대인데, "아시"는 오나라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문사이다. 예를 들어, "阿好,阿去라는 말은 '好不好,去不去'(좋아 싫어? 갈거야 말거야?)라는 물음의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아시'는 '是不是'(그렇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16) 이것은 오히려 더 근거 있는 주장이기도 하며, 반응 지점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 환자에게 "어디가 가장 아픈가요?"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 반드시 "아", "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시에 아시로 칭했든 아니든 간에, 분명히 내경 중의 "아픈 곳으로 경혈로 삼는다"(以痛為腧)는 것은 이미 현대 MPS의 반응점 취혈법과 비슷하다.(2)
*「歷史」와 「現代」의 병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혈의 명명은 대부분 고대인들이 음양오행, 장부기혈, 경맥유주, 해부위치, 경혈기능, 취혈방법, 골도분촌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천문지리, 물상의 형태 등과 결합하여 유추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결정하였다(3). 이렇게 실질을 중시하는 해석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한나라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현미경이나 확대경의 발명(약 15세기경 유럽에서나 가능)이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사물의 표면이었고 세밀한 해부가 어려웠다. 만약 고대 의가들이 정말로 혈도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세포와 섬유 조직이라는 용어는 이미 의학적으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중의학의 진단은 대부분 표면적인 관찰에서 비롯되며, 예를 들어 설진, 안색 보기 등을 통해 여러 증상의 설명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도의 깊이를 정했을까? 그것은 사람의 몸이 본질적으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절단할 수 있고, 관통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간 지역의 동굴이라는 개념으로 피부 아래나 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할 수 있었으며, 당연히 합리적인 "상상"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경맥의 개념이 무술을 연마할 때의 '기'의 흐름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한다면, 왜 한나라에서 송나라까지 약 천 년 동안 王惟一 선생은 여전히 두신분부와 사지 각부로 경을 나누는 방식으로 300여 개의 혈명을 배열했을까? 그리고 아직 기의 "끝없는 고리" 순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즉, 실용적인 추론으로 신체 내외부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체표면에 다른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중요한 고전 침구 저작은 단지 억측적인 방식으로 '기'의 보이지 않는 감각을 설명한 적이 없다. 근대인들은 자신의 체내에서 호흡, 맥동, 장의 연동, 감각 신경의 전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체표면의 26개 선에 있다는 사실을 고서를 참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고대인이 경맥 순행 이론을 세우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도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로써 유일하게 가능한 가설은 경락은 결코 체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혈도 역시 기를 조절하는 허브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인의 지혜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중의학 문화가 없기 때문에 MPS의 반응점만 보고 선을 연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의학 문화가 생긴 후에는 12선 또는 361혈 이외의 새로운 발견을 해야 하며,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문화 결정성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는 물론 현대 경락의 본질을 대표하지만, 당초부터 송나라까지의 수백 년의 전적을 보면, 취혈, 위치 설정과 주치가 반드시 "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맥기는 원래 지단에서 심을 향해 이동하며, 혈맥을 강의 흐름에 비유하여 그 량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경락의 십이경 순행과 자오유주의 응용이 더해지면서 '기'의 모호한 개념이 후대나 근대 사람들의 사고를 사로잡았다. 그저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여전히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만질 수 없는 방식으로 "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언젠가"(總有一天) 과학기술이 우리가 "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경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하다. 20세기 말의 사람들이 "언젠가"라고 말할 때, 천 년 후, 즉 30세기를 의미할 수도 있을까? 아마도요! 그렇다면 한대 고대인들이 "언젠가"라고 말할 때 송대를 의미했을까? 그리고 송대 고인들이 "언젠가"라고 말할 때, 오늘날의 우리를 의미했을까? 그러면 역사가 나타내는 시간 상황이 나온다. 20세기의 우리는 한대, 송대보다 더 빌전하여, 고대인의 의문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미래의 "언젠가"를 바라는 것처럼, 한대와 송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드시 섬세한 해부, 생리, 혈역학 등이 없었을 것이다. 즉, 고대인의 당시 사회문명은 전신에 전달되는 물질, 전신에 내재된 감각 또는 메시지 전달 시스템을 "가설"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고대인은 언어, 문자, 지식, 개념 때문에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혈청, 혈장, 신경계, 융모 연동, 미세혈관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묘사할 수 없었다. 단지 기, 또는 경맥, 낙맥 등과 같은 크고 포괄적인 명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목적은 "어느 날"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 더 많은 답을 얻어내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만약 우리 세대가 선현들의 용도를 살피지 않고 여전히 '기'로 칭하고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발전 방식은 아닐 것이다!
*결론
수당시대 의가들의 경혈귀경은 다소 다르지만, 그 나름의 개인적인 근거가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된다.(16) 이는 귀경이 저자들의 인위적인 재결합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다. 경맥과 장부를 인체의 내외부 연관 개념에 부합하도록 하여, 침술을 사용하여 체표면 조작을 통해 체강 내장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시경, 영상의학, 외과 수술 없이는 어떤 민족도 내장 질환을 직접 치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맥에 장부가 명명된 후, 체표점의 명칭도 조합될 가능성이 생겼고, 어떻게 연속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 생겼다. 이는 사실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일찍이 존재했던 역사적 지식임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와 "현대"가 영원히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기억력이 있는 한, 고고학은 끊임없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1. | 歐陽八四,高洁:針灸溯源-腧穴的起源與發展。 針灸臨床雜誌:1999;15(7):1-4。 |
| 2. | 黃維三:針灸科學。國立編譯館,台北:1985。 |
| 3. | 腧穴學總論。針灸學(上),知音出版社。台北:1996。 |
| 4. | 劉杰:腧穴命名初探。山東中醫學院學報:1995;19(5);343-5。 |
| 5. | 吳彌漫:從《內經》看十二經脈理論的形成過程。 中華醫史雜誌:1992;22(4):240-3。 |
| 6. | 陳方佩:肌筋膜症候群的針灸治療。臨床醫學雜誌:1996;38(1):25-36。 |
| 7. | Travell JG, Simons DG. Myofascial pain and dysfunction: The trigger point manual. Baltimore: Williaams & Wikins, 1983. |
| 8. | 戴銘:楊上善針灸學術思想研究。中國針灸:1995;90(2):33-5。 |
| 9. | 宋興:《針灸甲乙經》研究述要。中國針灸:1995;(6):37-40。 |
| 10. | 慶慧,宋紅湘:甄權及其對針灸學發展的貢獻。 中國針灸:1997;520(9):565-6。 |
| 11. | Campbell SM: Regional myofascial pain syndromes. In The Fibromyalgia Syndrome, Rheumatic Disease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15, edited by Bennett RM, Goldenberg DL, Saunders WB. Philadelphia, 1989. |
| 12. | 莫逸:論孫思邈對針灸學的貢獻。中國針灸:1997;520(9):52-3。 |
| 13. | 張儂:敦煌《灸經圖》簡介。中國醫史雜誌:1997;27(3):137。 |
| 14. | 孫忠年:復繪王壽”十二身流注五臟六腑明堂”考。 針灸臨床雜誌:1998;14(9):51-4。 |
| 15. | 針灸學。啟業書局,台北:1978。 |
| 16. | 高忻洙、胡鈴、黃學勇:關於腧穴的幾個問題。 中國針灸:1998;(7):427-8。 |
| 17. | 黃龍祥:腧穴歸經源流初探。針灸臨床雜誌:1994;10(5):1-2。 |
| 18. | 盛維民:腧穴定位,命名的外在原因。針灸臨床雜誌:1995;11(4):5。 |
| 19. | 周然宓:腧穴與非腧穴是相對的。浙江中醫學院學報:1994;18(6):43-4。 |
| 20. | 鄭少祥:《內經》腧穴的幾種特殊定義法。 陜西中醫學院學報:1990;12(2):30。 |
| 21. | 王立君:《內經》腧穴總數考。陜西中醫函授:1996;(5):11-2。 |
| 22. | 王澤濤:試論《難經》對腧穴學的貢獻。遼寧中醫雜誌:1995;22(3):133-4。 |
| 23. | 李鼎:從同名穴看經穴的發展過程。上海中醫藥雜誌:1997;(5):38-9。 |
| 24. | 高俊雄、程幸農:俞募穴的初步研究。中國針灸:1986;(3):28-31。 |
| 25. | 李鼎:藏醫俞、膜、脈之特點。上海中醫藥雜誌:1998;(3):32-3。 |
| 26. | 歐陽八四:針灸溯源-論經絡學說的形成。針灸臨床雜誌:1998;14(7):1-3。 |
*원문은 아래에..
-針灸穴道的源起探討與MPS的關係(https://www.cmaa.org.tw/paper/1999acup04.htm)
'동의학 이야기 > 경락, 경맥의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씨기혈 학술사상의 심층 이해(대만) (0) | 2025.04.03 |
|---|---|
| 경혈 주치의 형성(黃龍祥) (2) | 2025.03.30 |
| 침뜸의 개념, 이론, 문헌 등의 연구성과(중국) (0) | 2025.03.27 |
| 귀안혈(鬼眼穴)에 대하여 (0) | 2025.03.21 |
| 경혈의 변천/변화(黃龍祥) (0) | 2025.03.16 |